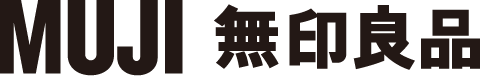[칼럼] 그린 인프라
게시:

도쿄에서 길을 걷다 보면 여기저기서 공사 중, 건설 중이라는 표지판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열리는 도쿄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도로와 빌딩 등의 인프라 정비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소개하려는 내용은 인프라이긴 인프라지만, 그린 인프라입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인공구조물이 대표적인 기존의 사회 기반(그레이 인프라)에 대항하여 식물과 토양이 지닌 ‘초록의 힘’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국토 조성, 지역 조성을 진척시키려는 겁니다.
그린 인프라란
예를 들어 수목과 흙이 갖추고 있는 보수력(保水力)을 활용하면 빗물을 모으거나 흡수시키고, 흘러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지하수를 채워서 홍수 대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린 인프라란, 자연 고유의 시스템과 생태계의 다양한 기능을 끌어내 지역 과제에 대응함으로써, 이를 사회기반으로 기능시키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레이 인프라의 보충·대체 수단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매력을 활성화시키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 재해 방지·감소 효과 등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린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자원·에너지 고갈,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한 토지 이용 변화,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 증가, 지역 경제 정체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과제의 대응책으로 주목받으며 높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그린 인프라
이렇게 쓰면 현대사회의 과제와 위기감에서 생겨난 새로운 생각처럼 느끼기 쉽지만, 실은 먼 옛날부터 그린 인프라는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산간지에서 볼 수 있는 계단식 논이 그 예입니다. 일본에서 벼농사는 본래 중산간지의 수전(水田)이 주류로 ‘산사태 지역’이나 ‘토석류 터’에서 계단식 논이 개척되었다고 합니다. 중장비도 없던 시대에 이런 산간 지역의 토지가 오히려 논을 만들기 쉬웠다고 합니다. 이 계단식 논은 쌀 재배 이외에도 보수·홍수 조정·산사태 방지 등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수전(水田)은 치수와 이수로 쓰이는 다목적 댐’이라는 말도 이러한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환경론의 바이블이라 일컬어지는 『물과 풀과 흙』의 저자인 토미야마 가즈코 씨는 “무논이 사라지면 그만큼 홍수가 늘고, 수자원을 잃게 됩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산의 나라, 지진의 나라인 일본에서 “사람들은 무너지기 쉬운 국토를 마주하고, 쌀 재배를 통해 자연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워온” 것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지원하는 그린 인프라
또, 수전(水田)은 다양한 생명 생태계를 받아들이고 키워가는 요람이기도 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물장군, 물방개 같은 수생곤충이 생식하고, 이를 먹는 물고기와 개구리, 또 이들을 먹는 뱀, 뱀을 먹는 새들 등, 다양한 생물의 연쇄가 생겨납니다. ‘생물 다양성 유지’라는 의미로도 계단식 논은 가까이에 있는 그린 인프라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를 지켜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오랜 시간, 농가 사람들에게만 맡겨왔습니다. 농촌지대의 고령화, 과소화가 진행되며 경작을 포기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와중에, 1970년에 벌인 생산 조정을 계기로 계단식 논의 절반은 사라졌다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가까이 있던 그린 인프라가 기반부터 무너졌다는 소리입니다. 요즘 호우로 인해 매우 큰 피해가 일어나는 원인이 기상이변만이 아니라, 그린 인프라가 더 이상 인프라로 기능하지 않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산나무가 만드는 당산숲
요코하마 국립대학 명예교수인 미야와키 아키라 씨는 “4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남자”로 알려진 식물생태학자입니다. 미야와키 씨는 “토지 본래의 숲이라면 화재에도, 지진에도, 태풍에도 견디고 살아남으며,” “재해 대책에서는 숲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고 역설합니다. “토지 본래의 숲”이란, “그 고장의 수호신이 깃든 숲으로 대표되는, 당산나무로 이뤄진 당산 숲”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일본 전국에 약 15만 개가 넘는 당산 숲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현재는 그 수가 격감하여 “자연재해가 큰 피해를 불러오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개발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야와키 씨는 “선조들은 개발을 할 때 모두 죽이는 짓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연에는, 사람의 얼굴로 비유하자면 볼처럼 만져도 괜찮은 곳과, 손가락 하나라도 닿아서는 안 되는 눈처럼 매우 약한 부분이 있고, 선조들은 개발할 때에 이른바 눈 안에 손을 넣지 않았다. 즉, 약한 자연을 남겨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연을 상징하는 장소에는 사당을 만들고, 이 숲을 자르면 벌이 내린다, 이 수원지에 쓰레기를 버리면 벌이 내린다는 식으로 종교적인 징벌 의식을 잘 활용해, 토지 본래의 약한 자연을 남겨 두었던 게 아닐까요?” 하고 미야와키 씨는 말합니다. 자연에 대한 그러한 배려를 저희 현대인은 잊어버리고 만 것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