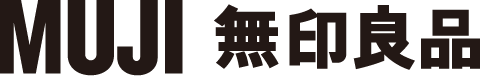[칼럼] 적재적소?
게시:

(이번 주 칼럼은, 과거에 발신했던 칼럼을 ‘칼럼 아카이브’로써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스포츠 팀 내의 포지션 배정부터 기업 인사, 장관 임명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적재적소’라는 말이 쓰입니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씀. 또는 그런 자리 (『표준 국어 대사전』)’라는 해설과 같이, ‘적재’의 ‘재(材)’는 인재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본래 어원은 전통 가옥이나 절 등을 짓는 건축 현장에서 어떤 건물인지에 따라 ‘목재(木材)’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칭하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고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1000년을 훌쩍 넘는 세월을 보낸 지금까지 멀쩡히 남아있는 이유는 곳곳에 적재적소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가 깃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적재적소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나무의 특성을 살려
1000년의 나이를 먹은 나무는 재료로 쓰더라도 1000년을 견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무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무의 특성과 성질을 살려, 이를 잘 조합했을 때 비로소 오래 간다’고 합니다. 호류지, 야쿠시지를 복원하고, 마지막 궁목수 동량이라 칭해지는 니시오카 츠네카츠 씨의 말에 따르면, 호류지에 있는 당탑은 ‘왼쪽으로 휘어지려고 하는 나무와, 오른쪽으로 휘어지려고 하는 나무를 같이 사용함로써 부재끼리의 힘이 서로의 특성을 막아주어 건물 전체에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이상적인 사회를 축소해둔 모습처럼 보입니다.
애초에 ‘나무의 특성’은 움직이지 못하는 나무가 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변 환경에 스스로를 맞춰간 결과가 반영된 모습입니다. ‘나무의 특성은 나무의 마음’이라는 인식을 품고 가장 적절한 자리를 제공해주었을 때 비로소 그 생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고르지 않기 때문에 아름답다.
호류지, 야쿠시지에 있는 건축물에 쓰인 각 부재들은 ‘천 개나 있는 동자기둥(들보 위에 세우는 지지 기둥)이나, 늘어서 있는 기둥이나,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르지 않지만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모든 자재가 규격에 맞춰 만들어져 모두 똑같은 기둥이 늘어서 있어도 이런 아름다움은 연출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니시오카 씨는 말합니다. 다양성이 탄생시킨 아름다움을 고대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걸까요?
각본가 야마다 타이치 씨의 대표작 중 하나로 1983년부터 1997년까지 방송된 ‘들쭉날쭉한 사과들’이라는 TV 드라마가 있습니다. 학벌 지상주의로 이루어진 가치관이 연애와 진로에 그늘을 드리운 시대가 배경으로, 규격에 맞지 않는 등장인물(들쭉날쭉 사과)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큰 공감을 받았는데, 균질화된 결과만을 요구하는 답답한 사회 속에서 ‘들쭉날쭉’한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줄로 죽 늘어서지 않은 가치관
적재적소라는 생각은 대량생산 · 효율 · 균질화와 정반대에 위치하는 ‘육아’에서도 통합니다. 수업을 할 때는 얌전하지만 체육 시간이 되면 갑자기 기운이 나는 아이, 교내 축제에서 눈에 띄는 아이, 사람을 잘 웃게 하는 아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다정한 아이 등, 과거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아이들이 있었고, 이렇게 아이들 사이에 차이가 있어도 괜찮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학교에서는 계산이든 한자, 줄넘기든, 뭐든 ‘일반적인 수준’으로 해낼 것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모든 아이들을 일률적으로 대하며 같은 결과를 내려고 하는 학교 사회의 답답한 분위기가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의 한 가지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잘하는 게 있어도 되고, 못하는 게 있어도 좋습니다. 스스로가 ‘잘하는 것’을 살릴 수 있는 자리를 아이가 찾아낼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주는 너그러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이에게 무엇이 ‘적재적소’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어른이 ‘상식적인 기준’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 요리 속 적재적소
‘적재적소’는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도 있습니다. 바로 제철 재료를 제철에 사용하는 겁니다. 제철을 맞이한 재료는 생명력이 넘쳐나며, 해당 시기에 사람의 몸이 필요로 하는 성분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봄에 먹는 산나물은 겨우내 몸 안에 쌓인 독소를 배출시켜주고, 여름에 제철을 맞이한 박과 채소들이 체온을 적절하게 가라앉혀 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의 무라고 해도 부위에 따라 적재적소가 다르다고 합니다. 무의 윗부분 1/3은 무가 스스로 추위를 견디기 위해 당도를 높여 달콤해진 부분입니다.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섬유 결이 가늘기 때문에 가열해도 흐물흐물해지지 않는 특성이 있어, 무를 큼직하게 썰어 삶아 만드는 요리나 무 스테이크 등에 활용하면 풍미가 두드러집니다. 가운데 1/3은 적절하게 윤기가 흐르는 부분으로 단맛과 매운맛의 균형이 잘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윗부분 1/3에 비하면 큼직한 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로로 썰지, 가로로 둥글게 썰지, 어떤 방식을 취하냐에 따라 식감과 풍미를 다르게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1/3은 아직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수분이 많고, 벌레로부터 몸을 지켜내기 위해 매운맛이 강하며, 껍질도 두꺼운 부분입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고 절단면을 크게 하여 마구 썬 다음, 햇볕에 말려 수분을 제거하면 떫은맛, 매운맛이 날아가고 풍미가 짙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재적소를 알아두면 채소의 생명을 온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소재의 특성을 꿰뚫어보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적재적소’를 통해 사용된 재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성품을 아름답고 튼튼하게 오래 유지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렇게 특성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대량생산을 위해 처리하기 쉬운 균일성을 추구해왔습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적재적소’라고 착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교육 현장을 비롯하여 인간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쯤에서 잠시 멈춰 서서 진정한 적재적소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참고도서:
『나무에게 배우다. 호류지·야쿠시지의 아름다움』 야쿠시지 궁목수 동량 니시오카 츠네카츠 (소학관문고)
『나무의 생명, 나무의 마음』 니시오카 츠네카츠, 오가와 미츠오, 시오노 요네마츠 (신조문고)